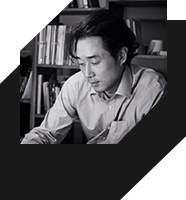다국어
FLOW
권위와 권력 사이
예술상의 흐름
- 작성자
- 글_박지수·황규관·김일송
예술 작품과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예술상은 예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예술가들을 독려하고 작품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예술상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하면서 상의 권위만큼 권력으로 작동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가치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예술상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현대미술을 추동했던
미술상의 역할을 되찾길
미술상의 역할을 되찾길
상(賞)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도구 중 하나로 예술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설립되며 각 예술 분야의 성취를 입증해왔다. 상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 문화 분야의 경우 최소 2,500년 전부터 상이나 트로피를 수여하는 관습이 존재했다고 한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왕립 아카데미와 전문가 협회 등이 수여하는 상들이 특히 증가했고 20세기에도 빠른 확산세를 보여줬다. 미술 분야에서 1984년에 제정된 영국의 ‘터너상(Turner Prize)’은 이후 설립된 많은 미술상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 터너상은 1969년 영국에서 제정된 문학상인 ‘부커상(Booker Prize)’을 모델로 제정된 것이다. 1990년대에 터너상이 대중적으로 성공하자 1996년 미국의 ‘휴고 보스상(Hugo Boss Prize)’, 2000년 프랑스의 ‘마르셀 뒤샹상(Prix Marcel Duchamp)’ 등 세계 각지에서 유명 미술상들이 제정됐다.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미술상을 만들거나 지원하면서 미술 후원과 마케팅의 목적을 동시에 이루고자 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과 ‘송은미술대상’ 등이 민간의 영역에서 꾸준히 수상자를 배출하며 동시대 한국 미술의 지형도를 그려왔다. 2012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운영한 ‘올해의 작가상’은 공적 영역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술상은 미술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사람들을 결집하고 상호 간에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형성한다. 미술상의 관심은 수상자에게만 집중되는 듯하지만, 다른 예술상과 마찬가지로 미술에 대한 믿음 자체를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미술상은 저마다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젊은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수상 작가의 나이를 제한하거나 회화, 조각, 사진 등 특정 장르를 북돋우기 위해 매체 제한을 두고 운영되는 미술상의 사례는 흔히 발견된다. 자국의 미술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 대상자의 국적이나 활동 지역을 국한해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미술상의 설립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른 상과의 차별화를 이루는 것은 미술상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됐다. 상금과 수상 혜택을 독보적 수준으로 제공하면서 상의 권위와 유명세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교한 설계를 통해 수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미술상의 사례는 비교적 드문 편이기에 ‘자밀상(Jameel Prize)’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자밀상은 이슬람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동시대 미술과 디자인을 위한 국제 예술상이다. 2009년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이 설립한 이 상은 중동 기반의 미술 후원 기관인 아트 자밀(Art Jameel)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자밀상의 설립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이 일찍부터 중동의 이슬람 미술 컬렉션을 수집해왔다는 점과도 관련성을 지닌다. 이 상은 21세기 이슬람 문화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논의가 일어나도록 돕고 동시대의 예술적 실천과 이슬람 전통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미술상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특정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상도 눈에 띈다. 스위스의 픽테(Pictet) 그룹이 2008년 제정한 ‘픽테상(Prix Pictet)’은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진상이다. 매회 물, 지구, 불, 인간 등과 같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후보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발한다.
인간을 주제로 열린 2022 픽테상 ⒸPrix Pictet
한편 미술상이 지금보다 더욱 각광받고 현대미술을 추동하는 제도이자 바로미터로 기능하던 시기가 있었다. 해외의 경우 영국의 주요 지상파 방송 ‘채널 4(Channel 4 Television Corporation)’가 터너상을 후원하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터너상 수상자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올해의 작가상이 처음 설립되고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이 매년 운영되던 2010년대 초중반에 수상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기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미술상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작가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미술상이 매년 수여될 필요가 있는지 혹은 운영 주기가 적절한지, 수상 작가와 작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 상이라는 제도는 그것이 가지는 권위와 형식의 특성상 더욱더 냉철하고 지속적인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그 책임감의 무게를 인지하고 운영돼야 할 것이다.
비평의 창조성이 담보하는
문학상의 신뢰성
문학상의 신뢰성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욕망하는 존재 같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언행에 대한 반응과 그 반응의 방향을 자신도 모르게 욕망한다. 이는 사실 ‘살아 있음’의 증표이기도 한데,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위와 발화를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너무도 쉽게 말해지는 성찰이나 반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음의 행위와 발화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언어에 국한해 말하자면, 대화는 이런 욕망을 밑바탕으로 하며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다음 발화는 제약되거나 증폭되고,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기초적인 경험에 무거운 문제를 비쳐 볼 때 얻을 수 있는 점이 적잖다. 일상의 행위나 발화가 그러할진대 문학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독자의 반응을 기대하거나 욕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면 문학 자체가 하나의 대화 양식이기 때문이다.
비평가는 여러 독자 중에 좀 더 세심한 독자이며 작품에 대한 반응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작품에 참여하는 정도가 깊다. 문학작품에도 논리가 있는 법인데 작품 내적 논리는 어디까지나 작가의 주관적 · 경험적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논리화되지 않은 무의식이나 기억의 심층이 작가의 주관적 · 경험적 논리를 흩뜨려 놓기도 한다. 사실 작품의 성패는 이 둘의 긴장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비평가는 그 지점을 자신의 언어로 규명하는 독자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작품에 개입하는 도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나저제나 비평의 중요성이 환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평 활동은 비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작가들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 행위가 모이고 흐름을 형성하면서 비평가는 비평가대로 작가는 작가대로 창조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도 얻게 된다. 고금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언제나 문제는 이 사회적 성취 때문에 일어난다. 왜냐면 사회적 성취도 그게 사회적인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총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총량은 제도나 규범으로 완전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층위와 장치들에 의해 제한된다. 작가가 평생에 걸쳐 창조적인 작품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당대의 작품들도 모두가 창조적일 수는 없다. 이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증명해주고 당대의 현상이 보증해준다. 문제는 명백한 이 사실을 그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
문학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지금처럼 박해진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앞에서 말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숙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학상을 수여하는 쪽의 문제이기도 하고 받는 쪽의 문제이기도 하며, 양쪽에 참여하지 못하는 쪽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학상은 작품에 대한 일종의 합의된 반응이며 보상인데, 합의의 절차와 합의의 주체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는다면 문학상은 금세 추문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문학상을 더 늘리는 방법이다. 당연히 오늘날 부쩍 늘어난 문학상의 원인이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문학상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는 점점 그 무게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당대의 합의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숱한 당대의 합의가 누적돼 형성된 ‘역사적 합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권위이며, 통속적으로는 권력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 권위 혹은 권력이 합의한 바를 사람들은 ‘주요’ 문학상이라 부른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우리는 권력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국가권력에 워낙 시달렸던 기억을 가져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권력에 대한 예민함은 아직은 장려할 만한 미덕이다. 문제는 권력에 대한 예민함이 역사적 합의로서의 권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권력이 권위를 등에 업고 나타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문학적 지성은 끝내 그 둘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권력 비판’이 언제나 적절한 것도 아니고 냉철한 이성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권력 비판’ 자체에 보상과 반응에 대한 욕망이 (과하게) 끼어들면 우리가 말하는 비판의 덕목은 상당히 얇아지고 만다. ‘반권력의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제는 권력도 권력이지만 비판에 대해서도 새로운 비판이 있어야 할 지경이다. 따라서 문학상이 당대의 창조적인 작품에 대한 합의된 보상이고 반응이 되려면, 합의 자체에 비평 과정이 수행돼야 하며, 사실 합의 자체가 비평 행위여야 맞다. ‘주요’ 문학상을 비판하기 위해 새로운 문학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 새로운 문학상은 ‘주요’ 문학상에서 행해지는 합의보다 더 비평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이런 상식 중의 상식, 기초 중의 기초를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면, 작가보다 문학상이 더 많다는 조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품도 그래야 하지만, 비평도 사회적 합의도 창조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창조적일 수 있나? 그 답은 먼저 비평과 합의 과정에 많은 고난과 고뇌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밖에 나는 모르겠다. 그랬을 때만 우리는 진정 창조적인 작품에 그에 합당한 보상과 반응을 돌려줄 수 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문학 행위이며, 속화된 민주주의가 감당할 차원의 것이 아니다. 문학이 세속적인 민주주의를 초월해야 하지 그것에 끌려가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다양성 존중을 위한
예술상의 발걸음
예술상의 발걸음
지난 3월 열린 ‘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95th Academy Awards)’ 최고의 영예는 양자경(楊紫瓊) 주연의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돌아갔다. 이번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한 가운데 악착스러운 국세청 직원으로 분했던 제이미 리 커티스(Jamie Lee Curtis)는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더 많은 여성이 상을 받고,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운을 뗀 후, “하지만 더 큰 문제로 ‘논 바이너리’가 남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성별 구분이 없는 시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논 바이너리(Non-binary)’란 남성이나 여성의 전통적 범주로 규정되지 않는 성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번 시상식에 앞서 <엠파이어 오브 라이트(Empore of Light)>의 감독 샘 멘데스(Sam Mendes)는 배우 엠마 코린(Emma Corrin)이 지난해 BBC와 진행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젠더 뉴트럴(Gender-Neutral)’ 시상이 머지않아 하나의 경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국 출신의 배우 엠마 코린(Emma Corrin)은 2021년 자신의 성 정체성은 논 바이너리라고 커밍아웃했으며, 지난해 BBC 인터뷰에서 “논 바이너리로서 여성 부문 후보에 오른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성별 구분을 없애고 단일 부문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계 전방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연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토니상(Tony Awards)’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연극상 토니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연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시상식으로, 공연계에서는 영국 ‘로런스 올리비에상(Olivier Awards)’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시상식이다. 토니상 측은 올해 후보자 중 한 명으로 뮤지컬 <& 줄리엣(& Juliet)>에서 줄리엣의 친구 메이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저스틴 데이비드 설리번(Justin David Sullivan)을 지명했지만, 그는 시상식 불참을 통보했다. 자신을 논 바이너리로 규정하는 그는 후보로 입후보하려면 남성 혹은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행위이자 기존의 시스템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불참의 변을 밝혔다. 그를 수상 후보에서 제외한 토니상 측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시상 부문이 포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을 없애거나 세분화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시즌 진행 중 기준의 변경은 불가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엠마 코린과 아시아 케이트 딜런 ⒸIMDB
그러나 같은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뮤지컬 <맥베스(Macbeth)>에서 말콤 역을 연기한 배우 아시아 케이트 딜런(Asia Kate Dillon) 역시 토니상에 같은 주문을 한 바 있다. 그 역시 자신을 논 바이너리로 규정하는데, 토니상에서 여성 후보로 입후보를 권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앞서 2019년 에미상과 미국 배우 조합상에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시상식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앞서 변화를 수용한 건 영국 ‘내셔널 텔레비전 어워즈(National Television Awards)’이다. 내셔널 텔레비전 어워즈는 2008년 처음으로 남녀 연기상 구분을 없앴고, 2017년 미국 ‘MTV 영화 & TV 시상식(MTV Movie & TV Awards)’이 젠더 프리(Gender-Free) 시상식을 선언하며 연기상에 젠더 프리 방침을 적용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국제 영화제(Internationale Filmfestspiele Berlin)’에서도 2021년부터 성별 이분법의 틀을 깨고 ‘젠더 프리 연기상’을 시상하고 있다.
음악계에서는 ‘그래미상(Grammy Awards)’이 가장 먼저 젠더 프리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은 2012년부터 팝 보컬, 컨트리 보컬, R&B 보컬 부문에서 남녀를 통합해 시상하고 있다. 영국의 대중음악상인 ‘브릿 어워드(The BRIT Awards)’는 지난해부터 성별의 구분을 없애고 남녀 솔로 아티스트상을 통합해 ‘베스트 브리티시 아티스트’라는 단일 최고상을 도입했다.
공연계에서는 500석 미만의 극장인 오프, 오프-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오비상(Obie Award)’이 오래전부터 성별 구분 없이 시상하고 있다. 한편 공연 전문 웹진 ‘왓츠온스테이지(WhatsOnStage)’가 주최하는 ‘왓츠온스테이지 어워즈’, 뉴욕 밖에서 활동하는 공연 비평가들의 조직 ‘아우터 크리틱스 서클(Outer Critics Circle)’에서 주관하는 ‘아우터 크리틱스 서클 어워즈’도 올해부터 성별의 구분을 없앤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공연계 시상식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를 발견할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장르를 막론하고 가장 앞서서,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은 젠더 프리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국내 공연계 현실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장의 변화를 체감한다면 보수적인 시상 제도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좋아요
3
코멘트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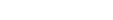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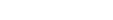
 아르코 통합플랫폼 바로가기
아르코 통합플랫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