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 아닌 주관의 힘,
'감상'으로 나를 말하는 시간
- 작성자
- 글_소현지 (웹진 에이스퀘어 편집부)
2025년 3월, 웹진 <에이스퀘어>가 주목한 주제는 ‘지금, 여기, 우리의 감상’입니다. 감상은 그저 감상일 뿐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의 감상을 찾아 읽는 걸까요? 이번 호에서는 ‘주관적인 감상’의 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장르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에서 체감하는 감상 문화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좌) 제17회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이브
(우)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스틸컷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이브
봄이 오면 어김없이 시작을 말하게 됩니다. 새싹, 새 학기, 새 출발…. 문화예술계에서도 봄은 ‘새 작품’의 계절입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우수한 신작 공연을 발굴해 선보이는 ‘공연예술 창작산실’은 겨울의 추위를 견뎌 낸 끝에 피어나는 봄꽃만큼이나 반가운 존재입니다.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등 6개 장르의 신작 31편이 모두 큰 관심과 성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새 출발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공연으로 창작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꼽고 싶습니다.
팔복리 문해학교에 다니는 ‘영란’, ‘춘심’, ‘인순’, ‘분한’은 교실에서만큼은 할머니가 아니라 어엿한 학생입니다. “여자가 글을 배워서 쓸데가 어디 있냐?”라는 타박 앞에 번번이 풀이 죽었던 네 학생은 이제 커다란 책상 앞에 둘러앉아 한글을 배웁니다. 이들은 어느 날 찾아온 다큐멘터리 감독 ‘석구’ 앞에서 “이 나이 먹고 글 배우는 게 자랑이냐?”라고 말하고, 시를 쓰자는 문해학교 선생님 ‘가을’ 앞에서 “시는 아무나 쓰냐?” 하고 고개를 내젓지만 결국 가장 멋지고 씩씩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시를 지어 발표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봄이라는 언급은 아무 데도 없었지만 영란과 춘심, 인순, 분한이 입을 모아 “가시나!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고 외치던 장면에서 무대로 쏟아지던 조명이 꼭 환한 봄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감상은 어떠셨나요?
2025년 3월, <에이스퀘어>가 주목한 주제는 ‘지금, 여기, 우리의 감상’입니다. 날마다 수십 수백 개의 작품이 새롭게 공개되는 오늘날, 작품을 먼저 본 사람들의 감상은 곧 수십 수백 배가 되어 인터넷 공간을 떠돌아다닙니다. 그중에서는 읽는 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듯 공감 가는 문장으로 가득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감상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작품을 본 게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상도 있습니다.
작품을 관람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감상을 살펴보는 일이 일상이 된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는 감상이 전문가나 비평가의 ‘비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들이 저마다 생각과 경험을 풀어낸 ‘주관적인 감상’이 작품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객의 주관적인 감상이 전문가의 비평 못지않게 작품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그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것입니다.
SQUARE에 수록된 이진송 칼럼니스트의 <관객, 작품을 재발명하다: 변화하는 비평 환경과 문화>에서는 올해 초 온라인 입소문을 타고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 <서브스턴스>와 함께 오늘날 SNS에서 생산되어 유포되고 있는 감상 문화를 살펴보며, “텍스트를 읽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주관적인 감상’의 힘에 주목합니다.
FLOW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감상 문화를 문학, 시각예술, 공연 등 장르별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3월은 겨우내 공모와 심사가 이루어졌던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결과가 발표되고 예술인이 한 해의 작품활동을 계획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에 PRISM에는 문화예술데이터연구소의 도준태 대표와 함께 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예술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2025년 문화예술 공공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실었습니다.
SCENE에서는 청년예술인과 기획자, 기술전문가를 연결해 예술-기술의 융복합을 도모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 ‘2025년 제4회 에이프캠프’의 신다영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스틸컷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이브
“가마이 보니까 시가 / 참 만타 / 여기도 시 / 저기도 시 / 시가 천지삐까리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속의 넘버 ‘우리는 가시나’는 작품의 실제 모델 중 한 분인 박금분 할머니의 작품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 쓰기를 망설이는 네 할머니에게 가을 선생님은 말합니다. “시에는 정답이 없어요!” 무엇이든 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자 비로소 길가의 간판에서, 식당의 메뉴판에서, 노래자랑대회 신청서에서 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들이 쓴 시에는 한글과 함께 새롭게 눈 뜬 세상이, 온몸으로 겪은 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감상도 시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할머니의 시 속에 할머니의 세월이 담겨 있듯, 우리의 감상에는 우리가 살아온 나날이 담깁니다. 나와 다른 방향에서 걸어온 사람은 나와 다른 풍경을 볼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감상은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의 감상을 찾아 읽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한 작품을 만나면 자신만의 감상을 기록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에는 정답이 없다’는 가을 선생님의 말처럼 웹진 <에이스퀘어> 15호가 소개하는 글이 지금, 여기, 우리의 정답이 아닌 감상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알림: <에이스퀘어>는 당분간 격주로 수요일마다 두세 편의 글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더 자주, 조금 가벼운 구성으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웹진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 혹은 인터뷰이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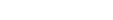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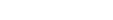
 아르코 통합플랫폼 바로가기
아르코 통합플랫폼 바로가기